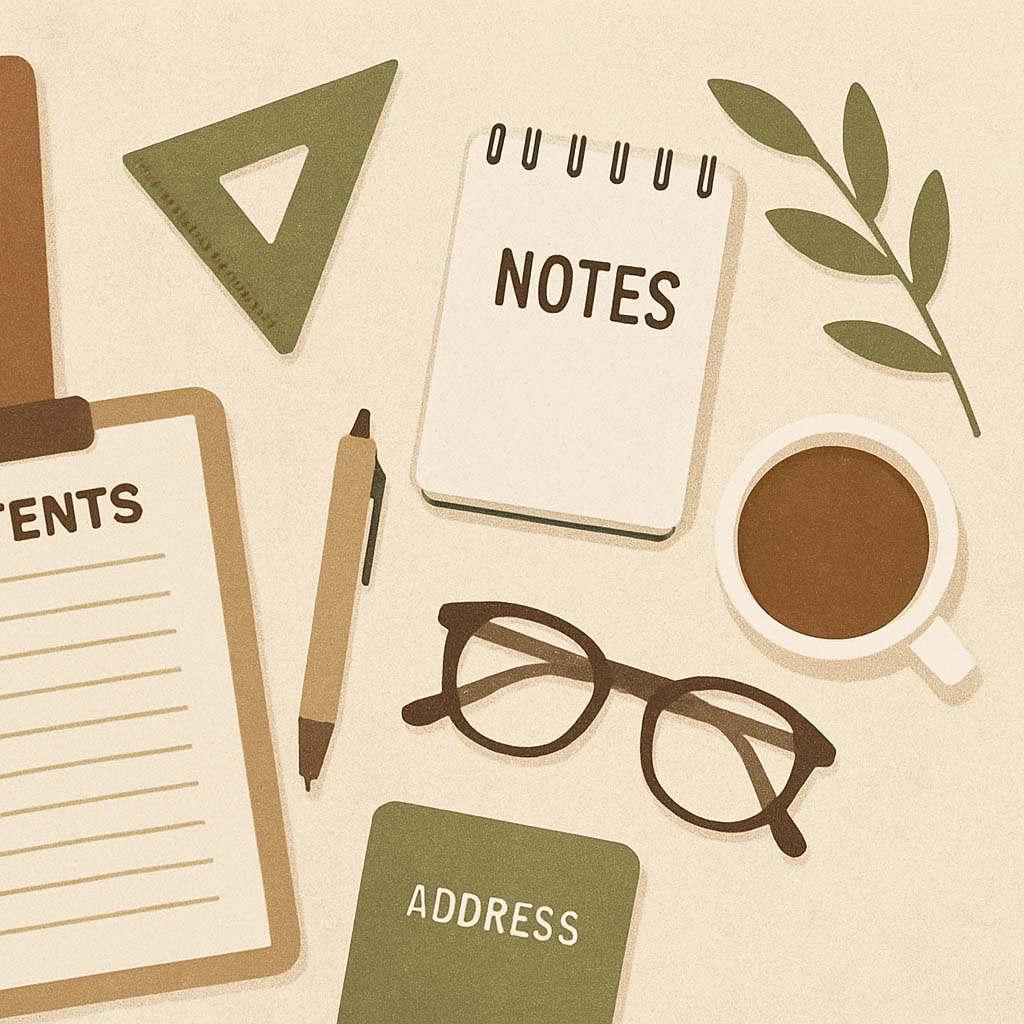티스토리 뷰

보험금 청구나 사망 이후 재산 정리와 같은 문제를 다루다 보면
"법정상속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법정상속인이 정확히 누구지?' 하고 물어보면,
확실히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사망과 관련된 각종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정상속인에 대해, 어렵지 않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법정상속, 왜 중요할까요?
사망이 발생하면 남은 재산이나 권리·의무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특별한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죠.
보험금, 예금, 부동산, 심지어 소송권까지 —
모두 '누가 법정상속인인가'에 따라 정리되는 만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법정상속 순서, 이렇게 정리돼요
1순위: 자녀(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부모 또는 조부모(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이모 등)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에 포함되지만,
다른 상속인이 있을 경우 재산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중요 포인트
- 자녀가 있으면 →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 부모가 살아계시면 → 조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가까운 혈연 관계부터 우선적으로 상속된다는 원칙이에요.

2순위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도 순서가 있어요
2순위는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하는데,
- 부모님이 생존하면 → 부모님이 상속하고,
-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 → 조부모님이 상속합니다.
**'부모 우선 → 조부모 후순위'**로 기억하면 쉬워요.
상속 비율은 어떻게 나눌까요?
상속인 사이의 재산 분배 비율도 민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 자녀(또는 부모, 형제자매) 조합이라면 →
배우자는 1.5 몫, 나머지는 각각 1 몫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자녀 2명 + 배우자라면,
- 배우자 3/7
- 자녀 각각 2/7씩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게 나누면 됩니다.
이혼하거나 사실혼인 경우는?
- 이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 사실혼 관계(혼인신고 없는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해요.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각자 재혼했더라도,
자녀와 친부모 간의 법적 관계(상속권)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새 가정을 꾸렸더라도, 자녀는 여전히 친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의붓부모(새 배우자)와 자녀는 단순한 결혼만으로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고,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쳐야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상속권이 없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나 의붓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족 관계가 다양해진 시대에는, 유언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마무리하며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예금 인출, 부동산 상속 등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인이지만, 단독으로 전부 받는 경우는 드물다.
-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해도, 자녀는 친부모 상속권을 유지한다.
-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 의붓부모와 자녀는 입양해야 상속권이 생긴다.
- 유언장 작성으로 상속권이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다.
상속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다가, 막상 필요한 순간이 오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보험 실무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험 직권해지부터 실효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 해지 용어 총정리 (0) | 2025.05.10 |
|---|---|
| 실비보험 청구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 총정리 (0) | 2025.05.07 |
| 보험금 청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총정리|상해·질병 사고별 구비서류 안내 (0) | 2025.05.05 |
| 보험 1~5종 수술비 총정리|보장 범위와 수술 종류 쉽게 알아보기 (0) | 2025.05.04 |
| 보험 119대 질병수술비 완벽 정리|보장 범위 쉽게 이해하기 (0) | 2025.05.03 |
- Total
- Today
- Yesterday
- 성격테스트
- 6월 탄생화 꽃말
- 세븐틴 헹가래
- 6월 꽃말
- 소름돋는 심리테스트
- 화장품 성분
- 7월 탄생화
- 음식 심리테스트
- 심리테스트
- 세븐틴
- 연애 테스트
- 7월 탄생화 꽃말
- 동물 심리테스트
- 19금 심리테스트
- 티스토리챌린지
- 6월 탄생화
- SEVENTEEN
- 재미있는 심리테스트
- 7월 꽃말
- 신기한 심리테스트
- 오블완
- 커플 심리테스트
- 바람의나라연
- 그림 심리테스트
- 무의식 심리테스트
- 간단한 심리테스트
- 연인 심리테스트
- 성격 심리테스트
- SVT
- 연애 심리테스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